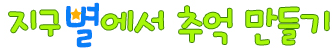반응형
밤 눈
기형도
네 속을 열면 몇 번이나 얼었다 녹으면서 바람이 불 때마다 또 다른 몸짓으로 자리를 바꾸던 은실들이 엉켜 울고 있어. 땅에는 얼음 속에서 썩은 가지들이 실눈을 뜨고 엎드려 있었어. 아무에게도 줄 수 없는 빛을 한 점씩 하늘 낮게 박으면서 너는 무슨 색깔로 또 다른 사랑을 꿈꾸었을까. 아무도 너의 영혼에 옷을 입히지 않던 사납고 고요한 밤, 얼어붙은 대지에는 무엇이 남아 너의 춤을 자꾸만 허공으로 띄우고 있었을까. 하늘에는 온통 네가 지난 자리마다 바람이 불고 있다. 아아, 사시나무 그림자 가득한 세상, 그 끝에 첫발을 디디고 죽음도 다가서지 못하는 온도로 또 다른 하늘을 너는 돌고 있어. 네 속을 열면.
기형도
이 세상에 28년간만 살다가 간 시인.
종로 파고다에서 소주 한병을 손에 쥔채로 죽었다.
살아 있을때는 한권의 시집도 내지 않았는데 죽은 뒤에는 그 어느 시인보다 더 많은 시들로 묶어져 나왔다.
詩를 詩답게 잘 쓰는 작가는 아니지만 그의 천재성은 누구나 인정하고 있다.
그의 시 중에서 울컥하게 만드는 시 한편을 더 소개한다.
엄마 걱정
열무 삼십 단을 이고
시장에 간 우리 엄마
안 오시네, 해는 시든 지 오래
나는 찬밥처럼 방에 담겨
아무리 천천히 숙제를 해도
엄마 안 오시네, 배춧잎 같은 발소리 타박타박
안 들리네, 어둡고 무서워
금간 창 틈으로 고요히 빗소리
빈방에 혼자 엎드려 훌쩍거리던
아주 먼 옛날
지금도 내 눈시울을 뜨겁게 하는
그 시절, 내 유년의 윗목

반응형
'글과 그림'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행복과 불행에 관한 삶의 역설 (0) | 2022.02.15 |
|---|---|
| 그 먼 나라를 알으십니까 - 신석정의 詩 (0) | 2022.01.12 |
| 마음 사용 설명서 (0) | 2022.01.10 |
| 루시아 헤퍼넌(Lucia Heffernan)의 요가 하는 병아리 (0) | 2021.12.15 |
| 마운틴 오르가슴(mountain orgasm) (0) | 2021.12.02 |
| 이게 그림? 일본 화가 케이 미에노(Kei Mieno)의 극사실주의 작품들 (0) | 2021.10.12 |
| 일본 화가 히라마쓰 레이지(平松礼二)의 멋진 수련 작품들 (0) | 2021.08.31 |
| (詩) 아야진 - 박봉준 (0) | 2021.08.06 |
| 태양이 잠드는 곳, 라싸에서 길을 묻다 - 김영화 (0) | 2021.08.05 |
| 키건 홀(Keegan Hall)이 연필로 그린 마이클 조던의 덩크슛 장면 (0) | 2021.07.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