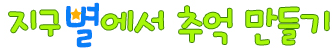굳이
어느 새벽꿈 속에서나마
나 만난 듯하다는 그대.
내 열번 전생의
어느 가을볕 잔잔한 한나절을
각간(角干)유신(庾信)의 집 마당귀에
엎드려 여물 씹는 소였을 적에
등허리에
살짝
앉았다 떠난
까치였기나 하오 참 그날
쪽같이 푸르던
하늘빛이라니.
김원길의 <취운정(翠雲亭) 마담에게>란 시다.
이 시의 내용은 이렇다.
...지례 예술촌 촌장 김원길 시인.
삼십여 년 전인 젊었을 적 어느 저녁 시인은 친구 몇과 얼려 술집으로 갔다.
대문에 들어서 대청마루에 오를 때까지, 방안에 앉아 술상이 차려 질 때까지, 술잔에 술이 따뤄져 한 순배 돌 때까지,
얼굴에 오른 취기가 불그레한 노을로 물들 때 까지, 젊은 시인에게 눈을 떼지 못하는 여인이 있었다.
친구들과 안부인사가 끝나고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지만 원래 개판인 정치 이야기가 진짜 개판으로 끝이 날 무렵
여인은 아주 낮은 소리로
"어디서 본 듯한..."
이라며 "얼굴인데"가 생략된 말문을 열다 말고 입을 닫아 버렸다.
궁금한 것은 시인 쪽이었다.
"우리가 어디서 만났어요"하고 물어도 그리스 여인처럼 생긴 긴 목을 모로 흔들며 대답하지 않았다.
시인은 몸이 달아올랐다.
여인이 던진 "어디서 본 듯한..." 수수께끼 한 자락을 붙들고 며칠 째 씨름을 해 봤지만 의문은 풀리지 않았다.
김성동의 소설 『만다라』에서 지산 스님의 화두인 <병 속의 새>처럼 풀리지 않는 미망이거나 혼돈일 뿐이었다.
다시 술집으로 갔다.
대답은 역시 눈을 내리 깔고 목을 흔드는 것이 전부였다.
시인은 술상에 엎디어 습작 노트에 뭉뚝 만년필로 위의 시를 써 쭈욱 찢어 여인에게 건넸다.
여인은 시를 읽고 울면서 옆방으로 건너간 후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
'글과 그림'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자네 집의 술 닉거든 - 김육(金堉)의 청구영언(靑丘永言) (0) | 2007.05.26 |
|---|---|
| 말(言)이 주는 교훈 (0) | 2007.05.14 |
| 유안진(柳岸津)의 '芝蘭之交를 꿈꾸며' (0) | 2007.04.04 |
| 너에게 묻는다 - 안도현 (0) | 2007.03.08 |
| 전라도 가시내 - 이용악 (0) | 2007.02.20 |
| 겁(劫, kalpa)이란? (0) | 2007.01.22 |
| 개가 새끼를 낳았는데 제사를 지낼 수가 없겠죠? (0) | 2007.01.22 |
| 미운 시어머니 죽이는 방법(?) (0) | 2007.01.06 |
| 노블리스 오블리제의 의미 (0) | 2007.01.06 |
| 일주일이란 시간은 ? (0) | 2007.01.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