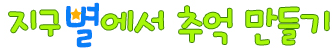제가 농부의 아들이라 시골 생활에 대하여는 조금 아는 편인데 제 어릴 적 시골에서는 하루에 밥을 다섯 번 먹었답니다.
아침, 새참, 점심, 새참, 저녁.. 이렇게..
식사량도 한 끼가 지금의 밥공기 두세 배는 되는 커다란 밥그릇이었답니다.
그 시절 온전히 육체노동으로 온갖 농사를 일궜으니 그렇게 먹지 않고는 배겨낼 재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처럼 온갖 먹거리가 널린 시절도 아니었구요.
근데 하루 다섯 끼의 식사 중 중간에 먹는 새참에는 빠지지 않는 것이 있는데 바로 막걸리입니다.
이게 걸쭉하고 탁하여 탁주(濁酒)라고도 하는데 시골에서 새참으로 먹는 막걸리는 농부들이 일에 지쳐 기진맥진, 중간에 기운을 북돋우는 역활을 한다고 하여 농주(農酒)라고도 하였답니다.
제 어릴 때는 막걸리는 허가받은 술 도가에서만 만들게 되어 있는데 이걸 시골에서 몰래 만들다가 발각이 되어 곤욕을 치르기도 하였지요. 그리고 쌀이 없어 식량난을 겪던 시절에는 쌀 사용이 금지되고 밀로 막걸리를 만들어 파는 바람에 술맛(?)이 떨어져 막걸리 판매가 급속히 떨어지기도 하였구요.
그 뒤 다시 쌀이 남아돌자 쌀을 원료로 하는 막걸리가 허가 되었는데 이 시기쯤 저를 비롯한 시중 잡배(?)류들이 막걸리 애호가로 변신하여 지금은 막걸리 열풍이 이어지고 전국 막걸리 종류가 그 수를 헤아리기 힘들 정도로 많습니다. 아마도 단일 술 종류 중에서 이만큼 많은 상표가 붙어 나오는 술도 드물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암튼 제가 일 년에 365병 이상은 마시는 술, 막걸리..
집에 들어와 제 블로그를 열어 치어다 볼 즈음에는 거의 얼큰하게 한 꼬뿌 들이킨 상태가 대다수입니다.
세상 뭐 있습니까?
그렇게 살다 빈손으로 떠날걸...
술 한잔하고 취기가 살짝 오르면 마음속 또 다른 창문이 하나 더 열립니다.
삭막하고 메마른 일상은 다 버리고 사랑밭 고랑을 일구며 그 속에서 알토란을 캐서 머금는 일을 한답니다.
그러다가 어떤 단어 하나에 부딪쳐 왈칵 눈물도 쏟아내기도 하고..
화두처럼 그것을 부여잡고 바로 세웠다가 뒤집기를 반복하기도 한답니다.
취중, 일기장 같은 수첩에 이런저런 속셈을 적어 두는데 정말 술이 취해서는 글씨가 그림이 되기도 하지요.
김영승의 詩처럼,
술에 취하여
나는 수첩에다가 뭐라고 써 놓았다
술이 깨니까
나는 그 글씨를 알아볼 수가 없었다
세 병쯤 소주를 마시니까
'다시는 술 마시지 말자'
고 써 있는 그 글씨가 보였다
그리고, 김소월 시 중에 아주 대중적인데도 별로 알려지지 않는 시 하나 "님과 벗"
벗은 설움에서 반갑고
님은 사랑해서 좋아라.
딸기꽃 피어서 향기로운 때를
고추의 붉은 열매 익어가는 밤을
그대여, 부어라, 나는 마시리.
위는 제 뇌 속에 있는 내용이고 원 詩는 조금 다르지유.
벗은 설움에서 반갑고
님은 사랑에서 좋아라.
딸기꽃 피어서 향기로운 때를
고초의 붉은 열매 익어가는 밤을
그대여, 부르라, 나는 마시리.
'그대여 부르라, 나는 마시리'보다 '그대여 부어라, 나는 마시리'가 휠씬 낫지 않나요?
'넋두리' 카테고리의 다른 글
| ㅎㅎ와 ㅋㅋ의 사용 설명서 (14) | 2020.04.02 |
|---|---|
| 귀신은 있을까? (22) | 2020.03.25 |
| 강엿 먹다가 임플란트 이빨 빠졌어요. (14) | 2020.01.03 |
| 여성시대 양희은씨의 목소리로 듣는 아들 결혼 이야기. (10) | 2019.12.01 |
| 그림일기로 보는 보톡스 부작용 (19) | 2019.11.25 |
| 실외기 밑에서 태어난 비둘기, 어미 되어 날아가다. (10) | 2019.08.15 |
| 오래 된 피아노, 동아원색세계대백과사전, 롯데파이오니아 전축 (16) | 2019.07.12 |
| 쓸모없어진 집 전화기 결국 해지 (6) | 2019.05.10 |
| 세상에서 가장 허망한 약속 .. 나중에 (8) | 2019.04.17 |
| 두견주(진달래 술) 담그는 법 (15) | 2019.04.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