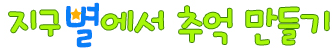나이는 스무살 정도...
이런 다큰 처녀가 옷을 하나도 안입고 온 동네를 뛰어다닙니다.
그 뒤로는 그 처녀의 엄마가 치마단을 붓잡아 들고
같이 쫒아 다닙니다.
동네 여인네들이 담 너머로 내다보고 쑤군거립니다.
저 미친년 또 지랄이네..!
초등학교 말미에 외지에서 공부하다가
여름방학이라 시골집에 들어와서 보았던 모습입니다.
왜 미치게 되었냐고 어른들한테 물어보면
연애를 잘 못해서 그렇지... 하고 뒷말을 숨깁니다.
어린 나이에 깊은 생각은 할 수 없었지만
연애,라는 단어가 잘못되면 사람이 미치기도 한다는 사실.
그것이 사건처럼 담겨졌습니다.
나도
살다보니
세월 속에서 그런 경험이 지나가고..
그리고,
순정(純情)으로 애달픈 사랑을 하며..
가슴저미며,
애타며,
기다라며,
항상 초초하여지고....
그렇게 세상이 일편의 시각으로 모든것이 뒤 바꿔져서
아무런 얘기를 하여도 귀에 들어 오지 않고
사랑밖에 아무것도 없는 세상에서 가장 예쁜,
복사꽃 얼굴로
지구 끝의 맹서를 함부로 하는... 내 딸.
내 딸이 지금 미친듯이 사랑을 하고 있습니다.
....................................................................................................................................................
추억은 누구에게나 아름다운 법이다.
과거 그 자체가 행복해서가 아니다. 시간적 거리감이 기억 속의 비루함을 지워주기 때문이다. 그것은 아픈 기억마저도 아름다운 풍경으로 바꿔버린다.
대중가요가 노래하는 아름다운 추억 역시 영혼에 새겨진 상처의 꽃무늬 같은 것이다. 아니, 그게 무슨 근거 없는 망발이냐고 반문할 사람도 많을 것 같다.
사랑보다 이별을, 기쁨보다 슬픔을 노래한 가요가 많지 않느냐고. 그렇고 말고다. 하지만 다시 생각해 보라. 실연 그 자체는 아픔이다. 그렇지만 세월이 흘러 그것을 회상하는 일은 어떤가? 실연의 아픔마저도 달콤하게 느껴지는 것이 또한 사실이 아닌가?
심수봉의 '그 때 그 사람'은 1978년 MBC 대학가요제 출전곡이다. 트로트, 그러니까 대학생답지 못한 노래라는 이유로 상위에 입상하지 못했다. 그러나 심사위원의 평가와 대중의 평가는 별개이다. 젊은이들 사이에서 그 인기는 대단했다.
심수봉 특유의 비음이 섞인 애절한 단조의 창법에서 그 이유를 찾기도 한다. 하지만 노랫말이 서정적 상상력을 불러일으키는 기본 문법을 충실히 따르고 있다는 점은 더 중요한 이유일 것이다.
노랫말에서 첫 구절은 매우 중요하다. 노래 전체의 인상을 좌우하기 때문이다. "비가 오면 생각나는 그 사람/언제나 말이 없던 그 사람"으로 이 노래는 시작된다. 비, 즉 물은 우울한 성질의 물질이다. 그러니까 첫 구절을 산문적으로 풀면, '우울할 때면 떠오르는 그 사람'이 된다. 여기서 단지 '그 사람'이라고 했지만, 실은 떠올려지는 '그 때'라는 어구가 여백 속에 채워져 있다. 그것이 듣는 사람이 은연중에 아름다운 추억 속으로 빠져들게 만든다.
지금 이 사람이 아니고, 그 때 그 사람이기에 늘 그는 아름다운 풍경 속의 오브제가 된다.
그렇다면, 정말 '그 사람'은 언제나 말이 없었을까? 물론 아니다. 그것은 시적인 포즈일 뿐. 이어지는 노랫말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외로운 병실을 찾아 와 다정하게 위로의 말을 건네던 그 사람이 아닌가? 다만 흑백 필름과 같이 '나'의 기억 속에 떠올려지는 '그 사람'이 말이 없을 뿐이다. 이런 저런 이성의 언어로 무장한 머릿속에 떠올려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은 늘 촉촉히 젖은 가슴에 떠올려진다. 그런데 궁금한 것은 왜 하필 '사랑보다 더 슬픈 것은 정'이라고 말하는 곳이 버스 안(=차안)이며, 또 다정하게 위로했던 곳은 병실이냐는 것이다. 둘의 공통점은 뭘까? 아마도 그것은 창(窓), 유리창일 것이다.
유리창 밖으로 세상 내다보기, 더 정확히 말하면 세상을 하나의 풍경으로 보기의 일종인 것이다. 세상은 비루하지만 풍경으로서의 세상은 아름다운 것이 아닌가.
유리창에 비라도 내렸던 것일까? 그렇다면 그것은 또 얼마나 근사한가.
한강 상류의 미사리 정도 되는 어딘가에서 비오는 날 카페의 넓은 창가에 앉아 차를 마셔본 사람은 안다. 그럴 때 세상이 풍경으로 피어나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까닭도 없이 슬퍼지지만 그 시간이 얼마나 행복한지도. 그렇지만 아닐 것이다.
비가 내리는 것은 거리가 아니고 '내 마음 속'이었을 것이다. 아니 둘 다였을 수도 있다.
폴 베를렌느가 노래하지 않았던가? 거리에 비 내리듯 내 마음에 눈물 내린다고. 그리고 까닭도 없이 흐르는 이 눈물은 무엇인가 하고 말이다.
- 하희정 문학평론가
'넋두리'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설비공 김씨가 대접 받아야 할 세상 (2) | 2008.04.04 |
|---|---|
| 아버지, 나의 아버지.. (2) | 2008.03.31 |
| 전화 한 통화라는 것은.. (2) | 2008.03.17 |
| 누군가에게 행복한 눈물을 흘리게 만들어 주세요. (0) | 2008.02.04 |
| 어느날 미친 봄을 산에서 만나다. (0) | 2008.01.29 |
| 一十百千萬, 9988234 (0) | 2007.12.24 |
| 감기에 걸리지 않는 방법 (0) | 2007.12.18 |
| 제수씨, 사랑합니다. (4) | 2007.12.10 |
| 우리네 인생사<人生辭> (2) | 2007.11.29 |
| 들은 얘기를 하나 해 드리겠습니다. (0) | 2007.11.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