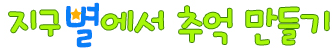미당 서정주(徐廷柱)님은 한일합방중인 1915. 5.18일 선운산 아래 질마재에서 태어 났습니다.
이 시대의 인물들이 지금 후대에서 친일과 사상등으로 재 평가가 많이 되고 있는데
두가는 그런 복잡한 것은 접어두고 미당의 매력적인 詩 하나를 소개코저 합니다.
아랫쪽에 옮겨 논 이 시의 제목인 '무등을 보며'에서 무등(無等)이란 바로 광주의 진산인 무등산(無等山)을 이야기합니다.
6,25 전쟁이 끝나고 쓴 시로 알려져 있으며 전쟁 직후 폐허속에서도 변함 없이 의연한 자태로 서 있는 무등산을 바라보면서 썼다고 합니다.
다음은 이 시의 이해에 관한 글을 인용하여 봤습니다.
그는 눈부신 햇빛을 받으며 선연히 서 있는 무등산의 모습에서 교훈을 찾고 있다.
즉, 인간의 본질은 물질적 궁핍으로 왜곡되거나 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속에서 더욱 찬란한 빛을 발할 수 있음을 자각하고 있다.
그러므로 아무리 가난해도 자식을 소중히 하고, 부부간에 서로 의지하고 믿음으로써 어려움을 헤쳐 나갈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나아가서는 자기 삶의 현실을 ‘가시덤불 쑥구렁(죽음) 속에서도 옥돌같이 묻혀 있다.’는 정신적 승리감으로 대치한 의지적 자세를 보인다.
어떤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고 당당하게 서 있는 산을 바라보며 시인은 헐벗은 자신의 처지를 차라리 떳떳하게 생각한다.
가난이란 한낱 우리 몸에 걸친 헌 누더기 같은 것이어서, 가난할수록 허릿잔등이 드러나듯이 우리의 타고난 순수한 마음씨는
오히려 더욱더 빛나게 된다는 것이 바로 이 시 전체를 떠받치고 있는 기본적인 토대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에 작자는 마침내 푸른 산의 그 기슭에 향초(香草)를 기르며 살 듯이,
아무리 궁핍하더라도 우리는 슬하의 자식들을 소중하고 품위 있게 기르며 살 수밖에 없다는, 삶에 대한 의연한 긍정의 자세를 취한다.
그러나 이러한 신념에도 불구하고 삶이 늘 순조롭게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설사 힘겹고 괴로운 때가 온다고 하더라도
서로에 대한 사랑과 배려로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 지혜를 가질 것을 시인은 당부하고 있다. 시는 인격이라는 말이 있지만
궁핍 속에서도 인간의 존엄성을 잃지 않으려는 시인의 고매한 인격이 이 시에는 아주 잘 나타나 있다.
그제 일요일, 무등산에 폭설이 내렸다는 소리에 좋아 달려가 육산의 넉넉함에 푹 잠겨 보았습니다.
상고대와 겨울 운치는 白雪冬山의 묘미를 만끽하게 하여 주었습니다.
전날 여당대표께서도 이곳을 다녀 가셨다는데 눈길에 미끄러지지는 않았는지 약간 궁금 하더이다.
산길이 눈으로 매우 미끄러웠습니다.
가난이야 한낱 남루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서 모두들..
제각기의 방식으로 행복의 범위를 설정하여, 그 속에서 만족하고 즐거워 하며 그렇게 사나 봅니다.
......................................................
무등(無等)을 보며
서정주의 詩
가난이야 한낱 남루(襤褸)에 지나지 않는다.
저 눈부신 햇빛 속에 갈매빛의 등성이를 드러내고 서 있는
여름 산(山) 같은
우리들의 타고난 살결, 타고난 마음씨까지야 다 가릴 수 있으랴.
청산(靑山)이 그 무릎 아래 지란(芝蘭)을 기르듯
우리는 우리 새끼들을 기를 수밖에 없다.
목숨이 가다 가다 농울쳐 휘어드는
오후(午後)의 때가 오거든,
내외(內外)들이여, 그대들도
더러는 앉고
더러는 차라리 그 곁에 누워라.
지어미는 지애비를 물끄러미 우러러보고,
지애비는 지어미의 이마라도 짚어라.
어느 가시덤불 쑥구렁에 놓일지라도
우리는 늘 옥돌같이 호젓이 묻혔다고 생각할 일이요,
청태(靑苔)라도 자욱이 끼일 일인 것이다.
'산행 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악견산에서 내려다 보는 합천댐 호수의 절경 (0) | 2010.04.06 |
|---|---|
| 쫓비산 산행 마치고 광양 매화축제장에 왔지만 아직은 몽우리 축제. (0) | 2010.03.15 |
| 태화산의 정상은 누구의 땅일까요? (0) | 2010.02.10 |
| 달마산 미황사, 동백꽃이 피었습니다. (0) | 2010.02.03 |
|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여관인 유선여관과 두륜산 (2) | 2010.02.02 |
| 겨울 산행으로는 계방산이 좋지만 너무 복잡해 - 겨울 산행시 특별한 준비물 3가지 (0) | 2010.01.12 |
| 2010년 1월 1일 새해 첫날 지리산 천왕봉 일출 산행 (0) | 2010.01.04 |
| 지리산 둘레길 1구간 - 지리산 산신령님과 미팅 결과는? (0) | 2009.11.03 |
| 지리산 둘레길 3구간 - 지렁이 우는 소리 들어 보셨나요? (0) | 2009.10.27 |
| 우주.. 안드로메다.. 태양계.. 지구.. 속리산.. (0) | 2009.10.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