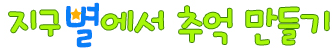언젠가는, 기필코, 두고 보라지….
무너진 사람을 일으켜 계속 걸어가게 하는 것은 아마 그런 다짐의 말들일 겁니다.
하지만 세월이 그 다짐을 둥글리고 미운 정이 빈틈을 메웁니다.
우리는 차마,
인간적으로, 끝을 보여주지 못합니다.
'기필코'가 '차마'로 변해가는 과정.
그것이 아무도 손뼉을 쳐주지 않는 우리네 삶의 길이 아닐까요?
.....................................................
"사부인이 세상 뜨실 때 연세가 몇이셨지?"
개수대에서 딸기를 씻는데, 어머님이 갑자기 궁금해하십니다.
요즘 그렇게 뜬금없는 말씀을 잘 꺼내시긴 하지만, 이번엔 좀 놀라지 않을 수 없더군요.
실은 저도 아까부터 돌아가신 친정엄마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예순다섯이셨죠."
"여태 살아 계셨어도 일흔다섯밖에 안 되시는걸. 어휴…."
어머님은 긴 한숨을 쉬셨습니다.
오래 전 세상 뜬 사돈 생각보다는 아마도 요즘 당신의 처지에 대한 서글픔에서 나오는 한숨이실 테죠.
하지만 저는 굳이 아는 척하지 않고, 하던 일을 계속했습니다.
흐르는 수돗물에 딸기를 씻고 꼭지를 따는 일.
실은 이 딸기 때문에 친정엄마 생각이 났던 참입니다.
생전에 엄마는 딸기를 무척이나 좋아했거든요.
저 역시 딸기를 제일 좋아하고, 여동생도 마찬가지.
이 계절이면 우리 삼모녀는 딸기로 배를 불리곤 했죠.
내가 결혼한 뒤로는 여동생과 엄마 둘이서, 그러다 동생마저 짝을 찾아 떠나고는 아마도 엄마 혼자서….
그런데 과연 엄마는 혼자서 딸기를 사다 먹긴 먹었을까요?
엄마가 암 선고를 받고서야 봇물 터지듯 그런 말이 쏟아져 나왔죠.
엄만 도대체 뭘 먹고 산 거야?
운동은 또 왜 그렇게 안 했어?
잠을 통 못 자면서 왜 말을 안 했어?
왜 말을 안 했어?
하지만 말을 했던들, 달라졌을까요?
저는 저대로 동생은 동생대로, 시집가서 아이 낳고 사느라 옆도 돌아볼 겨를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동생은 맞벌이로 매일 파김치가 되고, 저는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며 속을 끓이던 시기였죠.
그래도 엄마가 중병이 들면 당연히 내 집에 모셔와 정성으로 수발 들거라 생각했는데, 막상 현실이 되고 보니 그게 말처럼 쉽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모시기는 커녕 병원에도 혼자 보내게 될 때가 있었습니다.
약 부작용으로 음식 냄새조차 못 맡을 때도 전화로 잔소리 할 뿐, 밥숟갈을 떠 넣어 주지는 못했습니다.
아마 지금 같으면, 엄마를 그렇게 혼자 두지는 않을 겁니다.
억지로라도 데려와, 시어머니 방에서라도 함께 모셨을 겁니다.
사람의 생명이 타들어가는데, 되고 안 되고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때는 제가 뭘 몰랐습니다.
우리 엄마가 그렇게 속절없이 떠나버릴 줄 몰랐고, 나아지고 있다는 엄마의 말을 정말로 곧이 들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시어머니라도 저에게 좀 말해줬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다 엄마 훌쩍 떠나면 네 가슴에 한이 남는다고, 생전에 원 없이 효도하라고 말씀이라도 해주셨다면….
그 당시 제가 할 수 있는 건 주말에 장을 봐서 들여다보고 오는 것 뿐이었습니다.
뭘 사다 줘야 좋을지 몰라 딸기를 상자째 사들고 간 적이 있는데 다음 주에 가보니 그대로 상해 있었습니다.
엄마가 미안해하며 그러더군요. 딸기가 이상해. 이제 그 맛이 아니야….
엄마는 결국 그해를 못 넘기고 암 요양병원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이후 십 년째 저 역시 딸기 맛을 잃고 사네요.
그럼에도 오늘 딸기를 한 소쿠리 사다 쟁반 가득 씻어낸 까닭은 시어머님 때문입니다.
평소에 과일을 그다지 좋아하지도 않으시는 분이, 오늘은 갈급하게 딸기를 찾으셨거든요.
실은 어머님 역시 약 부작용으로 요즘 입맛이 헝클어진 상황입니다.
이 무슨 기막힌 운명일까요?
친정엄마를 암으로 떠나보내고 십 년 만에, 시어머님이 또 다른 암 선고를 받으셨습니다.
일반 항암제가 통하지 않아 신약을 드시고 계십니다.
그 때문에 입맛도 변했고, 감정도 생각도 오락가락하시는 모양입니다.
갑자기 세상 뜬 사돈 생각이 난 것도 그런 이유이겠지요.
그런 생각을 하며 어머님께 딸기 하나를 찍어 드렸습니다.
어머님은 아이처럼 순순히 입을 내밀어 받아 드시더군요.
또 하나 드리니, 또 잘 받아 드십니다.
그런데 어이없게도, 어머님은 이렇게 끝까지 며느리 손에 딸기를 받아 잡숫고 싶으신 모양입니다.
하는 수 없이 하나둘 세다시피 입에 넣어 드렸습니다.
그러고 있자니 기분이 묘하더군요.
예전의 괄괄하시던 어머님은 어디 가고, 주는 대로 받아먹는 아이가 마주 앉아 있습니다.
그렇다고 내 아이처럼 예쁘지는 않고, 꼭 남의 집 아이 밥 먹이는 기분이었습니다.
정작 내 아이는 어디서 밥을 굶고 있는데, 남의 아이 숟가락에 반찬을 올리는 기분 말입니다.
그런 속마음도 모르고 어머님은 눈가의 눈물까지 찍어내시며 한마디 하십니다.
"나는 마지막까지 이렇게 자식 효도 받는데, 네 엄마는 혼자 얼마나 외로웠을꼬."
나는 들고 있던 딸기를 접시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평생 시어머니 앞에서, 이 말을 할까 말까 망설이다 입 다물곤 했죠.
하지만 이번에는 할 참이었습니다.
"어머니, 십 년 전에도 그 말씀 하셨어요. 네 엄마는 혼자서 암과 싸우려면 얼마나 외로울꼬."
"그러게 말이다."
"그리고 또 뭐라고 하셨는지 기억나세요? 그게 다 아들 없는 죄다. 아들만 있었으면 며느리가 다 했을 것을.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도 네 엄마같이 외로운 처지 안 되려면 지금이라도 아들 하나 낳으라고."
어머님은 정말 토씨 하나도 안 틀리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저는 속으로 외쳤었죠.
두고 보세요.
어머니는 딸 없는 죄로 말년에 무척 외로우실 거예요.
하지만 세월은 흘러갔고, 오늘날 어머님은 전혀 외로워 보이지 않습니다.
아니, 당신이 외로운 분인 줄을 모르십니다.
왜냐하면 바보 같은 며느리가 딸기까지 알알이 찍어 드리니까.
언젠가는 어머님께도 외로움이 뭔지 가르쳐 드리겠다 다짐했었는데 저는 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내가 힘을 주자 어머니는 힘이 빠졌고, 내가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자 어머님은 귀를 잡숫고 말았습니다.
나도 내 인생 찾자 싶으니, 어머님의 생이 얼마 남지 않았네요.
내게 먹여 달라 입 내미는 노인에게, 외로움을 차마 어떻게 가르치겠어요.
하지만 오늘만큼은 할 말을 다 할 참이었습니다.
우리 엄마는 몸은 고달팠을지언정 마음은 외롭지 않았다고, 진짜 외로운 분은 어머님이라고 말씀드릴 참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의 말씀 한마디에 저는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내가 어디 틀린 말 했느냐? 지금 봐라. 며느리인 네가 다 해주고 있잖아. 며느리만 한 딸이 세상 어디 있다더냐. 너흰 끝내 아들 없어 어쩔 거냐. 쯧쯧쯧."
저는 허허 웃고 말았습니다.
어머님을 이제 와 어찌하겠어요.
나는 며느리 볼 일 없으니, 내 대까지만 바보로 살자 싶더군요.
하늘나라 우리 엄마는 아실 테니까.
누가 더 외로운 사람인지….
이 글은 조선일보 섹션 [friday] 웹에서 옮겨와 정리를 한 내용입니다.
'글과 그림'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대구미술관에서 전시중인 간송의 조선 회화 명품전 (8) | 2018.08.15 |
|---|---|
| 모항으로 가는 길 - 안도현 (8) | 2018.07.26 |
| 이탈한 자가 문득 - 김중식 (8) | 2018.06.09 |
| 신선미의 동양화와 개미요정 - 요렇게 매력적인 동양화도 있었네! (8) | 2018.05.29 |
| 치마, 팬티, 옳거니 (10) | 2018.05.11 |
| 이혼을 앞 두었던 어느 남편의 감동 일기 (12) | 2018.04.26 |
| 그 사람을 가졌는가 ? - 함석헌 (6) | 2018.04.25 |
| 속도 - 유자효의 시(詩) (8) | 2018.03.21 |
| 이봉수 화가의 작품과 13회 개인전 개최 (10) | 2018.02.07 |
| 북회귀선에서 온 소포 - 허연 (8) | 2018.01.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