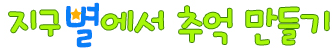93세의 엄마..
약간의 치매도 있고 기력도 많이 쇠하여 늘 긴장을 하고 있다.
금방의 일들은 거의 잊어버린다.
다만 치매가 그리움의 병이라 이전의 기억들은 모두 생생하게 밝혀 내시네.
우리 집에서 두어 달 모시다가 다시 동생네 집에서 주간보호에 다니다가 우리도 그렇지만 모두가 엄마를 모실 사정이 되지 않아 섣달 아버지 제사 때 동생들 내외 모두 모여 의논이 되었는데 결국은 요양원에 모시기로..
동생들이 엄마한테 사정하고 설득을 했는데 요양원에는 가지 않겠다고 하신다.
막내가 요양원을 알아보겠다고 한다.
그 뒤 설 명절 쉬고 시골 대문을 나서는데 뒤에서 엄마가,
'설 쉬고는 너희 집에 있고 싶다.'라고 하시네.
옆에서 집사람이 그 말에 고개를 숙인다.
나도 가슴이 무너진다.
집사람과는 수십 년간 애증과 애정을 섞여 나눴던 고부간.
이 말이 가슴에 박혀 엄마를 요양원에 보내지 못하고 다시 우리 집에 모셔왔다.
저녁...
아내가 엄마 목욕을 시키고.
둘이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귀가 많이 어두운 엄마 귀에 대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엄마가 옛이야기를 한다.
열여덟 살 섣달에 시집을 와서 열다섯, 열아홉 살 시누이한테 말할 수 없이 모진 구박을 받으며 살았던 이야기, 없는 시골 살림에 억척스럽게 살림을 일구며 시아버지 시어머니를 모셨는데 노년에 중풍이 와서 몇 년씩 그분들의 뒷 수발을 했던 이야기..
한참을 듣던 아내도 눈물을 흘리며 이야기한다.
'어머님, 저도 스물두 살에 시집을 와서 벌써 나이가 예순다섯이 되었네요.'
엄마가 말씀하신다.
'그래, 내가 안다. 니도 정말 고생 많이 했제. 내가 잘 알고 있다.'
이 말 한마디에 아내의 어깨가 무너진다.
자주 들어보지 못했던 말...
시골의 어려운 살림에 내 공부도 겨우 시켰는데 동생들은 엄두를 낼 수 없었다.
신혼인 우리는 몇 년 동안 월급의 반 이상을 동생 학비와 용돈으로 송금했고 나중에는 아이 돌반지 결혼 패물도 모두 팔아 동생 공부 뒷바라지를 했었다.
그 덕분에 첩첩 시골 산골 동네에서 우리 집은 유달리 돋보였고..
아내는 농사철에는 거의 시골에서 지냈다.
아이를 들쳐없고 할 줄도 모르는 농사일을 도왔고 시골에 내려갈 때도 먹을 것을 사서 가지 않고 밤이 새도록 시부모가 좋아하는 음식들을 만들어 내려갔다.
그런 내용에 대하여 모른척 내색을 않던 엄마가...
치매에 걸려 속 마음을 흘러낸다.
아내는 엄마를 껴안는다.
아내와 엄마가 부둥켜안고 울고 있다.
저녁에 아내는 베개를 들고 엄마 주무시는 방으로 갔다.

'넋두리' 카테고리의 다른 글
| 2차선의 여유와 행복 (16) | 2026.01.20 |
|---|---|
| 아파트 동 대표를 하면서 느낀 점 (29) | 2025.12.09 |
| 치아가 빨리 상하는 것도 유전이라는데.. (24) | 2025.09.21 |
| 목화씨 훔쳐 와서 심었는데 목화꽃이 피다. (17) | 2025.07.05 |
| 블로그 방문자 1,000만 명 (51) | 2025.05.16 |
| 물레방아 돌려서 전기 만들던 옛날 이야기 (13) | 2024.12.11 |
| 10년 만에 꽃을 피운 스투키 (13) | 2024.11.23 |
| 오래된 남자 친구, 오래된 여자 친구 (20) | 2024.11.21 |
| 김여사는 말로만 뱃살 빼는 중 (23) | 2024.11.19 |
| 티스토리야, 어디 아픈건 아니지? (20) | 2024.11.04 |